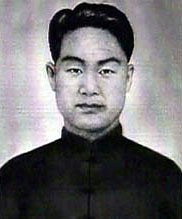| 삼가 등 합천에서 왜 3·1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을까? | |
|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다가온다. 경남경찰부에서 1936년 12월 작성한 고등경찰관계적록에, “삼가면(三嘉面) 금리(錦里) 소요는 악성(惡性)이다. 5명이 죽고, 38명을 체포했으며, 부상자는 20명이었다. (주: 안창호의 '한일관계사료집'에는 즉사한 자가 42명, 중상을 입은 자가 100여명). 소요 인원이 가장 많기는 (합천군) 삼가 금리의 1만명(주: 안창호의 '한일관계사료집'에는 3만명)으로서, 여기에 버금하여 진주와 하동읍내의 6천을 헤아릴 수 있고, 가장 적게는 김해읍내에서 7명이었다”라고 했다. 삼가(三嘉) 등 경상우도 합천에서 왜 3·1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을까? 1972년 8월 17일 동아일보가 3·1운동 중요 유적지 17개소에 기념비 건립을 추진했는데, 어떤 근거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합천지역 3·1운동(주: 삼가장터 3·1운동)이 아우내 및 제암리 3·1운동과 함께 선정된 걸까? 1907년~1909년 '삼가 의병단(三嘉 義兵團)'이 무슨 이유로 삼가지역에서 일어나 김화서 박수길 한치문 등 16명이 순국(애국장 추서)하고, 9명(애족장 추서)이 10년 형(刑) 등을 받았을까? 이는 경상우도, 특히 삼가 및 합천이 고향인 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의 사상적 영향 때문에 불같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아래 '남명, 퇴계, 내암, 서애'가 올린 상소와 당대 기록 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55세 처사(處士) 남명 조식(南冥 曺植, 1501~1572)이 삼가현 외토리 토골 뇌룡정(雷龍亭)에서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를 작성해서 1555년(명종10) 11월 19일 22세 명종에게 올렸다. "(중략)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하여 천의(天意: 하늘의 뜻)가 이미 떠나갔고 인심(人心)도 이미 떠났습니다. 소관(小官: 낮은 벼슬아치)은 아래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주색(酒色)이나 즐기고, 대관(大官: 높은 벼슬아치)은 위에서 어물거리면서 오직 재물만을 불립니다.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바는 무슨 일입니까? 학문을 좋아하십니까? 풍류와 여색을 좋아하십니까[好聲色乎·호성색호]? 활 쏘기와 말 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군자를 좋아하십니까? 소인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바에 존망(存亡)이 달려 있습니다. (중략)" (1555년 명종실록 10년 11월 19일), (남명집 권2 을묘사직소) □ 68세 처사 남명 조식이 1568년(선조1) 5월 26일 산음현 덕산 산천재(山天齋)에서 17세 선조에게 무진봉사(戊辰封事)를 올렸다. "(중략) (1559년~1566년 이황과 기대승이 벌인 사단칠정 논쟁 같이) 사람의 일을 팽개치고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것은 곧 입에 발린 이치[口上之理·구상지이]이며, 자신을 뒤돌아 보지 않고 들어서 아는 것만 많은 것은 귀에 발린 (죽은) 학문[耳底之學·이저지학]입니다. (중략) 저 윤원형(尹元衡, 주: 예조판서)의 세도(勢道: 권세)도 조정(朝廷)이 바로잡았는데[克正·극정], 하물며 소리(小吏: 아전)와 백사(百司: 백관) 무리가 도적질하며 나라의 심장을 차지하고는 국맥(國脈: 나라의 명맥)을 해치고 있는 이따위 여우나 쥐 같은 놈들의 목을 베기야[諸斧·제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중략)" (1568년 선조실록 1년 5월 26일), (남명집 권2 무진봉사) □ 68세 판중추부사(종1품)에 재직하고 있던 퇴계 이황도 1568년(선조1) 같은 해 8월 7일 무진봉사, 즉 시무(時務) 6개조인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를 막 즉위한 17세 선조에게 올렸다. "(중략) 계통(繼統, 주: 임금의 대를 이음)을 중히 하여 인효(仁孝)를 온전히 하소서. 신이 듣건대 천하의 일이 군위(君位)의 일통(一統)보다 더 큰일은 없다 합니다. 무릇 막중한 계통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은 아버지께 이어받으니, 그 일의 지극히 중대함이 어떻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지극히 크고 막중한 계통을 계승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 능히 그 지극히 크고 막중한 뜻을 아는 이가 적어서 효(孝)에 부끄러움이 있고 인(仁)에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승하여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선조 임금처럼) 혹 방지(旁支: 곁가지)에서 양자(養子)로 들어와 계승한 임금의 경우는 인효(仁孝)의 도리를 다하는 이가 더욱 적어서 이륜(彝倫: 떳떳하게 지켜야 할 도리)의 가르침에 대해 잘못을 저지르는 자가 더러 있으니, 어찌 깊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남명 조식처럼) 노장학(老莊學)의 허망함을 혹 즐기고 숭상하여 성인을 업신여기고 예법을 멸시하는 풍습이 간혹 일어나고, 관중(管仲)과 상앙(商鞅)의 학술과 사업은 다행히 전술(戰術)되지는 않았지만, 공리(功利: 유용성)를 따지고 이익을 꾀하는 폐단은 오히려 고질(痼疾)이 되었습니다. (중략)" (1568년 선조수정실록 1년 8월 1일), (퇴계집 제6권 소) □ 보시는 바와 같이 퇴계 이황은 남명 조식과 달리 실사구시와 법치를 선호하지 않았다. 퇴계는 성리학 외 노장학 등에도 심취한 남명 조식을 비난하고, 제나라 정치가 관중과 진나라 정치가인 상앙도 비판했다. 성리학만이 제왕의 길로 안내해 준다고 했다. 관중은 유일하게 중상주의를 주창한 인물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백성들을 먼저 부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40년 동안 제나라를 개혁하여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상앙은 법치로 유가(儒家) 훈구파를 밀어내고 형법·토지법 등을 제정하는 등 대개혁을 단행하여 100년 후 진제국(秦帝國)이 건국하는 기반을 세운 훌륭한 정치가였다. 상앙은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위층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어긴 왕자까지 처벌한 인물이다. 그런데 퇴계는 이런 인물들을 비판하며, 공리(功利), 즉 유용성을 따지는 정치를 척결하라고 17세 선조 임금에게 아뢰고 있다. 사문난적(斯文亂賊)인 이단(異端)의 학설이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남명과 너무나 다른 철학과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또한 퇴계는 남명의 날카로운 지적 및 비판과 달리,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건의책이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함구(緘口)한다. 무진육조소에서 '서리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곁가지 처럼 썼다. (남명의 무진봉사는 번역본 200자 원고지 30쪽 분량이고, 퇴계는 무려 117쪽 분량이다.) 퇴계 이황이 노비 367명, 전답 34만평을 가진 대부호였고, 남명 조식이 안빈낙도하는 담백한 삶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특히 남명이 퇴계와 달리 평생 '독립불구(獨立不懼) 둔세무민(遯世無悶)'한 삶이 크나 큰 차이다. 남명이 강하게 질타한 것은 '퇴계의 사단칠정론' 같은 구상지이(口上之理)와 구저지학(耳底之學)이었으며, 남명이 일관되게 추구한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지행합일(知行合一)과 민본(民本)과 법치(法治)였다.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저항정신이었다. 반대로 퇴계는 성학(聖學), 즉 성리학만이 왕도의 길이며 세상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퇴계는, 율곡 이이→김장생→송시열→권상하→한원진→이항로·기정진→김평묵·최익현으로 이어진 서인(노론)들이, '존주대의(尊周大義)와 사문난적과 위정척사'를 부르짖으며 기득권을 공공히 했던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남명(내암)과 퇴계(서애), 경상우도와 경상좌도의 확연한 차이다. (황태연 교수는 2018년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책에서, “송시열은 양명학·고증학을 ‘사문난적’으로 배격해 유학의 정통성을 성리학으로만 국한시켜 편협화·교조화했고, 조선의 역사를 기자(箕子) 이후로 재단하는 반유학적·반민족적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 49세 우의정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 1542∼1607)이 1589년(선조22) 기축옥사(己丑獄死) 때 보여준 언행이다. 1589년 정여립사건 때 길삼봉(吉三峰)이라는 누명을 쓰고 1590년 9월 억울하게 옥사한 남명 제자인 진주의 최영경이 의금부 감옥에 있을 때의 상황이 연려실기술에 나와 있다. 동부승지 백사 이항복(35세)이 우의정 서애 유성룡(49세)에게 최영경(62세)을 구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유성룡이 좌고우면한 것이다. 퇴계학파의 성향(disposition)과 성품(nature)이 엿보인다. "(종로구 필운동에서 살고 있는) 이항복이 공적인 일로 (3.5키로 떨어진 충무로 3가) 유성룡의 집에 갔다가 (남명의 수제자인) 최영경의 원통함을 극력으로 말하니, 성룡(成龍)은 다만 두어 말로 답할 뿐이었다. 항복(恒福)이 또, ‘대신(大臣, 주: 유성룡)으로서 구해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니, 성룡은, ‘내 같은 자가 어찌 감히 구할 수가 있겠는가’ 했다. 항복이 누누이 극진하게 말하니 성룡이 말하기를, ‘너무 강개(慷慨: 의기가 복받쳐 원통해 하고 슬퍼함)하지 말라. 세상 인심이 심히 험하니 부디 말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항복이 말하기를, ‘나는 영경(永慶)과 한 번 만나본 교분도 없는 데 누가 감히 의심하겠는가’하니, 성룡이 말하기를, ‘세상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일이 번져 가면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천금같은 몸을 천만 소중히 하라’고 했다." (연려실기술 14권 선조조 기축당적·己丑黨籍) 이런 성향이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1593년(선조 | |
| 파일 |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소식